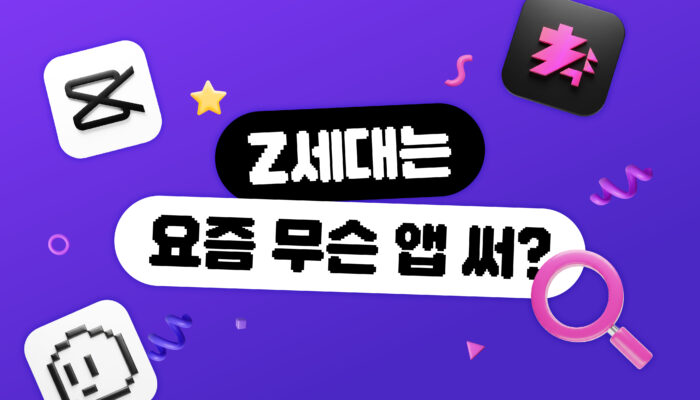원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날 지경;;
추억의 노래를 활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각인시킨 사례가 궁금하다면?
예전엔 광고 CM송이 대히트를 치거나, CF에 쓰인 노래가 그대로 차트에 진입하던 때도 있었죠. 그만큼 브랜드와 음악은 오랫동안 찰떡궁합처럼 활용되어왔는데요. 최근엔 이런 흐름이 조금 잠잠해진 듯 보였으나, 오랜만에 레전드 명곡을 영리하게 활용한 사례들이 소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웃음과 메시지를 동시에 잡아낸 두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 컴포즈커피 <이 밤의 끝을 ‘부여’잡고>
컴포즈커피는 가을 한정 신메뉴로 ‘부여 밤’을 활용한 음료를 출시하며, 뮤직비디오 형식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어요. 제목은 다름 아닌 <이 밤의 끝을 ‘부여’잡고>였습니다. 90년대 명곡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를 패러디해, 신메뉴의 핵심 키워드인 ‘부여 밤’을 말장난처럼 끌어온 재치 있는 설정이었죠. 단순히 제목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 가사에서도 ‘부여잡고’로 개사해 부르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원곡자인 김조한이 직접 모델로 출연해 포스터와 뮤직비디오를 함께 촬영했다는 점이 화제를 더했어요. 여기에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정재형과 김민수도 함께 출연해 영상의 웃음 포인트를 확실히 책임졌죠. 이들은 최근 플라이투더스카이의 ‘Sea of Love’,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 등 레전드 뮤직비디오를 놀라운 싱크로율로 재현해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번에도 그 특유의 코믹한 감성과 연출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어요.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넘겼고, “내 최애곡에 이게 무슨 일이야…”, “부여 밤 하나는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버렸다” 같은 댓글이 이어졌죠. 단순한 네이밍 아이디어로 끝날 수도 있었던 콘셉트를 추억의 명곡과 패러디 콘텐츠로 확장한 덕분에 더 큰 파급력을 얻은 셈이에요. 익숙한 멜로디와 감성을 유쾌하게 비틀어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각인시킨,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는 사례였습니다.
🎤 G마켓 <2025 G마켓으로 가요대잔치>
G마켓은 올해 다양한 할인 캠페인을 파격적인 광고와 함께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어요. 지난 9월에는 김경호·박완규와 함께 ‘G마켓 질러락 페스티벌(G락페)’을 선보인 데 이어, 11월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를 맞아 ‘G마켓으로 가요대잔치’라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엔 연말 가요 대축제 콘셉트로 진행되면서 설운도, 환희, 김종서, 민경훈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레전드 가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공개된 4편의 영상에서는 각 가수들이 자신들의 히트곡을 할인 품목에 맞게 개사해 부르며 웃음을 자아냈어요. 설운도는 <상하이 트위스트>를 “상의하의 상의하의 상의하의~ 트위스트 추면서”로 바꿔 패션/잡화 세일을 알렸고, 민경훈은 팬들 사이에서 ‘활어회 소주 원샷 우럭 두 개 더~’로 불리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부르며 진짜 활어회와 우럭 두마리를 들고 등장했거든요.🤣 댓글창에는 “민경훈이 진짜 우럭 두 개 더를 들어올리는 날이 오다니…”같은 반응이 쏟아졌죠. 현재 공개된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는 2천만 회를 훌쩍 넘겼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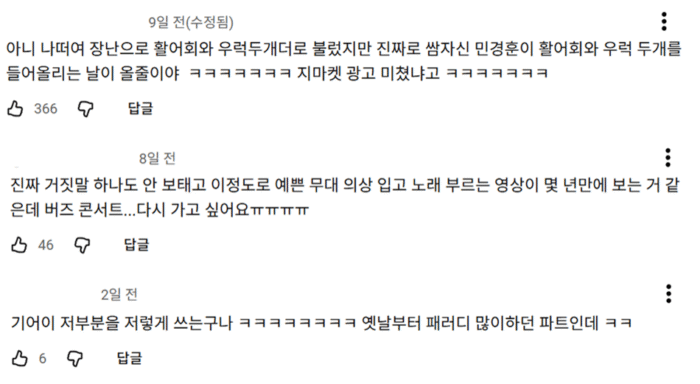
2000년대 전성기 스타들이 한 곳에 모인 것도 놀라웠는데 그 시절엔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유쾌한 콘셉트를 과감하게 활용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중장년층에겐 향수를, MZ세대에겐 재미를 동시에 건넨 거죠.
특히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멜로디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상에 주목하게 되고, 개사된 가사 덕분에 각 카테고리의 할인 혜택까지 기억에 남게 되니 브랜드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구조였고요. 연말 대형 이벤트의 스케일과 혜택을 동시에 인지시킴과 동시에 G마켓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캠페인이었습니다.
두 캠페인의 공통점은 단순한 추억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익숙한 콘텐츠를 브랜드 언어로 유쾌하게 재구성했다는 점이에요. 그 결과 웃음을 유도하면서도 브랜드 메시지를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연스럽게 새겨 넣을 수 있었죠. 기획자의 입장에선 강한 인지도를 가진 문화 자산을 빌리되, 단순 오마주를 넘어서 ‘왜 이 콘텐츠여야 했는가’에 대한 맥락과 연결성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일 듯해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례는 재미와 전달력을 모두 챙긴 크리에이티브 설계의 좋은 예시였습니다.